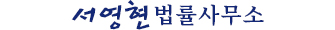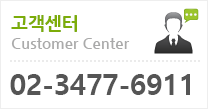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 정신병력 없으면 ‘업무상 자살’도 없다?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2-04-06 10:10 | 조회수 : 4,189 |
|
정신병력 없으면 ‘업무상 자살’도 없다?
산재인정 범위 지나치게 좁아 … 일본, 과로자살 폭넓게 인정 00대병원에서 2006년은 끔찍한 한 해였다.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전 2005년 11월에도 3년차 수술실 간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신경외과 수술실의 경우 2명의 간호사를 연달아 잃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신경외과 수술실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는 두 사건 모두 수술실 간호사라는 업무적·조직적 특수성으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생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아무개 간호사는 업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았다. 반면에 정신과 병력이 없었던 김아무개 간호사는 ‘충동에 의한 자해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08년 7월 산재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자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36조)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과로자살’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일본은 99년 자살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바꿨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기존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한해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이후 97년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이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정신장해 전반’으로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 법원은 과로자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최근에는 퇴직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까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등 과로자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우울증 전력이 없는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 안동시청 재산세 담당 7급 공무원이었던 유아무개씨가 2007년 지방세 표준전산화 작업과 행정자치부 감사자료 검토업무를 처리하던 도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목매 자살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고인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25 |
| 이전글 |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인가? |
| 다음글 |
34분꼴로 자살하는 대한민국, 사업장 자살 예방대책 논의 시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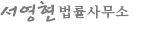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